조선일보
- 워싱턴DC=송동훈 문명 탐험가
입력 2020.06.10 05:00
워싱턴 D.C.의 라파예트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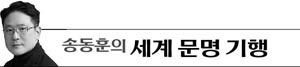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집을 겸하고 있는 백악관은 미국 권력의 중심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다. 대통령이란 직(職) 자체가 미국 독립혁명 이후 왕을 대신해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역사상 최초의 임기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은 자기 몫을 해냈다. 바로 이곳 백악관에서. 건물 전체가 하얗다고 해서 백악관이라 하지만 엄연히 앞과 뒤가 구별된다. 펜실베이니아 대로를 사이에 놓고 라파예트 광장과 마주하고 있는 북면이 앞에 해당한다. 대통령 공원과 워싱턴 기념탑으로 이어지는 남면이 뒤다.
백악관 앞의 피난처, 라파예트 공원
처음 백악관에 갔을 때부터 정면에 있는 공원에 '라파예트(Lafayette)'란 이름을 붙인 게 특이했다. 그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파예트 후작은 미국 독립혁명 때 참전한 프랑스 대귀족이었다. 라파예트 공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식처이다. 백악관 앞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수많은 시위대가 각자 주장을 쏟아내고, 수많은 관광객이 연신 사진을 찍어대니 난장(亂場)이 따로 없다. 라파예트 공원은 백악관 근처에서 그런 소란스러움을 피할 유일한 공간이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이며 '대중민주주의'의 개척자로 여겨지는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재임 1829~1837)의 거대한 기마상이 놓여 있다. 공원에 이름을 부여한 라파예트의 동상은 남동쪽 모퉁이에 있다. 높다란 기단 위의 라파예트는 몸을 비스듬히 튼 채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백악관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미국의 주요 행정부 건물이다. 그렇다. 라파예트 공원은, 라파예트 동상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다. 젊은 프랑스인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인들은 무슨 이유로 라파예트를 이토록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식민지의 자유를 위해 참전하다
라파예트 후작(Marquis de Lafayette·1757~1834)은 프랑스의 명문 귀족이었다. 본명은 'Marie Joseph Paul Yves Roch Gilbert Motier'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위와 재산을 상속받았다. 열여섯 살 때는 베르사유 궁정의 세도가인 노아이유 공작의 손녀와 결혼했다. 앞날이 창창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계몽과 이성, 자유와 혁명 시대였다. 1775년 시작된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다. 유럽의 많은 젊은이가 매혹됐다. 라파예트 역시 그랬고, 또래 귀족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기로 맹세했다.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는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함께하기로 했던 귀족 동료들은 미국행을 포기했다.

이미지 크게보기라파예트 공원 뒤로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보인다. 공원 한가운데 기마상의 주인공은 미영전쟁(1812년)의 영웅이자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라파예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에 그의 젊은 피는 끓어올랐다. 라파예트는 몰래 배를 타고 프랑스를 탈출해 아메리카로 갔다. 1777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한 라파예트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대륙회의 대표들에게 독립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군대 경력도 전혀 없는 프랑스 귀족을 바라보는 식민지 사람들 시선이 고왔을 리 없다. 대륙회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라파예트는 열정적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자유를 위해 싸우러 왔기 때문에 무보수로 헌신하겠다고, 대륙군의 병졸로라도 참전하고 싶다고. 대륙회의는 마음을 바꿔 라파예트를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1732~1799)에게 보냈다.
미국의 독립에 기여하다
1777년 7월 라파예트는 워싱턴을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다. 워싱턴은 라파예트의 품격 있는 행동과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좋아했다. 그는 풋내기 라파예트를 소장에 임명하고 참모로 기용했다. 파격적 대우였다. 여기에는 라파예트를 이용해 프랑스 내에서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프랑스의 참전을 끌어내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선택은 탁월했다. 라파예트는 워싱턴의 애정과 결정에 부응했다. 전쟁터에서는 부상을 겁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 포지 계곡(Valley Forge)의 겨울 숙영지에서는 대륙군 병사들과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뎌냈다. 평생을 호의호식했던 프랑스의 대귀족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라파예트는 군말 없이 병사들과 동고동락했다. 일선 지휘관으로서 능력도 점차 향상돼 여러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활약상은 약간 과장돼 프랑스로 전해졌고,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젊은 귀족과 장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미지 크게보기프랑스 귀족 라파예트 후작이 군복 차림의 조지 워싱턴과 그의 사저 마운트버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의기 투합했고, 둘의 우정은 미국이 프랑스 도움을 받아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니 오거스타 브라운스콤 作(미국 라파예트 대학 소장). /위키피디아
프랑스는 오랜 전략적 고민 끝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다(1778년 2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주장을 숙적 영국에 복수해야 한다는 감정적 이유가 압도한 탓이다. 그러나 선발대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프랑스 원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1779년 말, 라파예트는 프랑스로 달려갔다. 당대 최강을 자랑하는 영국군을 이기는 데 필요한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함대,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라파예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떠났던 밀항자는 베르사유 궁정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다. 특히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는 직접 그를 만나 미국과 독립전쟁에 관한 얘기 듣기를 즐겼다. 라파예트 파견은 워싱턴에게 '신의 한 수'로 드러났다. 그가 프랑스 대신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여 최정예 부대 6000명과 더 많은 함대의 원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원정군의 지휘는 로샹보 백작(comte de Rochambeau·1725~1807)이 맡았다. 라파예트와 로샹보는 워싱턴을 도와 영국군과 싸웠다. 특히 두 사람은 미국 독립전쟁 최후 전투인 요크타운 공성전에서 워싱턴의 군대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1781년 10월 19일).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기억한다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라파예트 후작 동상. /게티이미지뱅크
라파예트는 그렇게 미국의 독립에 헌신했고,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상징이 됐다. 미국은 백악관 앞에 조성한 공원에 그의 이름을 붙였고, 그의 동상을 세웠다. 동상을 자세히 보면 높은 기단 위의 라파예트는 백악관을 바라보며 빈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다. 기단 아래서는 한 여인이 라파예트를 향해 검(劍)을 든 손을 뻗고 있다. 검은 장차 미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할 라파예트의 빈손에 쥐어질 운명을 나타내는 듯했다.
독립전쟁을 벌일 당시 미국은 국가는커녕 식민지 연합체에 불과했다. 반면에 프랑스는 영국에 견줄 만한 강대국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처지도 바뀌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고, 프랑스는 제국의 지위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프랑스 도움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워싱턴의 라파예트 광장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수십 곳의 '라파예트' 이름을 딴 시와 타운,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동상 등이 그 증거다. 라파예트 기념일을 제정해놓고 있는 주(州)도 여럿이다. 9·11 테러 희생자는 물론이고 240년 전에 미국의 독립과 자유라는 대의에 헌신한 외국인들도 잊지 않는 미국. 여러모로 이 나라는 기억의 제국이다.
[프랑스 백작·프로이센 남작·폴란드 장군도… 라파예트 공원에 동상]
라파예트 공원을 장식한 외국인은 라파예트 후작만이 아니다. 프랑스군 사령관 로샹보 백작, 프로이센 출신 훈련 교관 슈토이벤 남작(Baron von Steuben), 폴란드 출신 공병 장군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Tadeusz Kosciuszko) 세 사람도 공원 한 모퉁이씩을 차지하고 있다.
슈토이벤 남작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대륙군을 훈련해 정예 군대로 변모시켰다. 탁월한 공병 장교였던 코시치우슈코는 주변 강대국들에 나라를 잃은 폴란드 군인이었다. 폴란드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코시치우슈코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무작정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는 새러토가 전투(1777년 10월)와 전략적 요충지인 웨스트포인트―오늘날 미 육군사관학교 위치―방어에 큰 공을 세웠다.
자국민의 헌신은 애국(愛國)이지만, 라파예트를 비롯한 타국민의 헌신은 은혜다.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애국과 은혜를 기억하고 추앙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0002.html
'미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럼프 대선 유세 올스톱...2차 TV토론도 불투명 (0) | 2020.10.02 |
|---|---|
| 막히는 링컨터널·북적이는 허드슨야드…맨해튼이 다시 살아났다 (0) | 2020.09.11 |
| [선우정 칼럼] 日帝를 美帝로 바꿔치기 (0) | 2020.01.22 |
| 오바마, 베트남 현지 식당서 공짜밥 먹은 사연은 (0) | 2019.12.12 |
| 삐걱대는 한·미동맹 ‘호주 모델’을 주목하라! (0) | 2019.11.21 |